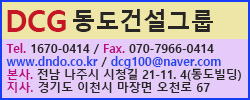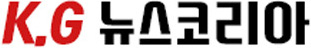올해 73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총수일사 이사 등재 4년 간 하락세 끊고 상승 전환
ESG위원회 설치 비율 늘어…"사회적 책임 높아"
집중·서면투표제 도입 높아져도 실시는 '미흡'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5년 만에 늘어났다. 총수일가가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이 5.2%(13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회에 오른 안건의 99.3%(7282건)는 원안대로 가결되며 이사회 견제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곳 중 신규 지정 집단과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2735개 계열사가 분석 대상이다.
공정위는 해당 대기업집단들의 ▲총수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운영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살펴봤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57.5%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하이트진로, 46.7%로 가장 높아
우선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는 433개사로 16.6%를 기록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지난 2019년부터 하락세였으나 올해 5년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의 비율은 셀트리온과 반도홀딩스가 39.0%로 가장 높았으며 KCC가 35.4%, KG가 34.7%, SM이 31.0%로 뒤를 이었다. 삼천리, DL,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등 5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총수일가가 많이 등재돼 있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인 '주력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45.0%(63개사)였다. 기타 회사(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에서 15.0%, 전체 회사에서 16.6%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35.5%(275개사)로 비규제대상 회사(8.6%)보다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말한다.
아울러 총수일가는 1인당 평균 2.2개,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5개 이사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42개 집단은 총수 본인(42명)이 118개 이사 직함을 보유 중이며, 34개 집단은 총수 2·3세(64명)가 159개 이사 직함을 갖고 있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비율은 5.2%(136개사)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2%를 기록하며 비율이 줄어들지 않았다.
미등기임원 중 과반수인 57.5%(104개 직위)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소속이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상장사(20.6%)가 비상장사(3.3%) 보다 약 6.2배 더 높았다.
특히 하이트진로(46.7%)가 가장 높으며, DB(23.8%), 유진(19.5%), 중흥건설(19.2%), 금호석유화학(15.4%) 순이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측면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걸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는다"며 "더구나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 회사가 50% 이상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이니 더욱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 안건 99.3% 원안대로 '가결'…ESG위원회 52.1% 설치
조사 대상 회사들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5%(1008명)이고, 회사당 평균 3.26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지난해 집계된 51.7%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분석대상 상장회사 소속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였다.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최근 1년 동안 이사회에 오른 안건 7837건 중 7782건(99.3%)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0.7%)에 불과했다. 이 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 수는 16건(0.2%)에 그쳤다.
해당 회사들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1008명) 중 과거 당사·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거래관계(건당 1억원 이상)가 있는 사외이사는 총 44명(4.4%)이었다.
또 이사회 내에서 지배주주·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관련법상 최소 의무 기준을 상회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ESG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ESG위원회 설치회사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로 통계를 집계했던 지난 2021년(17.2%)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아져 52.1%를 기록했다.
총수일가는 이사회 내 위원회 중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돼 참여하고 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은 총수 없는 집단과 비교해 보상위원회 설치는 25.6%포인트, 감사위원회 설치는 13.6%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총 26건이며, 그 중 22건은 총수 있는 집단에서 발생했다.
홍 과장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과 관련해 "2019년에 0.36%였던 게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0.36%에서 0.7%까지 오르긴 올랐는데 여전히 미흡한 수치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소수주주 위한 집중·서면투표제 실시율 "여전히 낮아"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267개사)로 5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실시하는 회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중투표제는 지난해 1건도 실시된 곳이 없었으나, 올해 조사에선 KT&G가 처음으로 실시하며 0.3%의 비율을 기록했다. 서면투표제를 실시한 회사 비율도 0.9%포인트 증가한 6.5%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이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제도 도입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집중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총수 없는 집단(18.2%)과 총수 있는 집단(2.8%)간 15.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최근 1년 동안 상장사에서 행사된 소수주주권은 총 36건이었다. 주주제안권 16건, 주주명부 열람청구권 10건, 주주 대표소송 제기권 3건,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2건, 이사회 의사록 열람 2건, 검사인 선임청구권 2건 등이 행사됐다.
이외에도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분 비율(73.3%)과 안건에 반대한 지분 비율(7.7%)은 해외 기관투자자(80.1%, 1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이후부터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비율이 매년 증가했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해(78.3%)와 비교해 5.0%포인트 감소한 73.3%를 기록했다.
국내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시 반대한 지분은 7.7%로 해외 기관투자자(12.6%)보다 크게 낮았다.
홍 과장은 "집중투표제가 KT&G에서 3월28일에 실시됐는데, 소수주주 측에서 추천했던 사외이사 후보는 선임되지 않았고 지배주주 측에서 선임한 후보가 사외이사 2명으로 최종 선임됐다"며 "소수주주 측에서 보면 성공한 집중투표제 실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최초로 집중투표제 실시 사례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